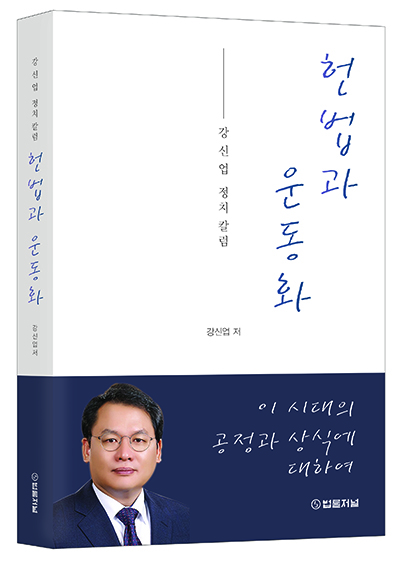모든 몰카는 사악하다. 프라이버시를 해치기 때문이다. 프라이버시는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인권이다. 그래서 프라이버시를 침범하는 것은 그 자체로 타인의 인권을 유린하는 범죄가 된다. 타인의 이메일이나 핸드폰만 몰래 열어 보아도 형사 처벌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더구나 범죄 목적으로 타인의 사무실에 들어가 사적인 부분까지 몰래 사진을 찍고 녹음하고 이를 여과 없이 공개한다면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가 된다. 하물며 몰카를 찍어 그 동영상을 세상에 공개하여 선거에 악용하는 행위는 매우 악랄한 범죄다. 더구나 그 대상이 한 나라의 영부인인 다음에야 말할 나위가 없다.
몰카를 찍은 최재영 목사는 대선을 불과 2개월여 앞둔 2022년 1월경 자신이 ‘김건희 여사의 돌아가신 부친의 친구 아들’이라는 관계를 이용하여 처음부터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김건희 여사에게 접근했다. 완벽한 공작을 위해 최재영은 김건희 여사를 옭아매고자 낚시 미끼로 사용할 파우치(일종의 손지갑)를 샀다. 처음부터 마음에서 우러나 마련한 선물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에서 구매한 것이기 때문에 최재영은 대금도 내지 않았다. 파우치값은 최재영의 배후 공범이랄 수 있는 서울의 소리 이명수가 냈다(이명수 개인의 돈인지, 서울의 소리 돈인지도 밝혀야 할 부분이다). 최재영과 이명수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는 장면까지 녹화하고 녹음했다. 그리고는 인간적 신뢰 관계에 호소하는 방법으로 그 미끼를 김건희 여사의 사무실에 던져놓는 데 성공했다. 그렇게 몰래 덫을 놓은 후 그들은 너무도 사악하게도 김건희 여사가 파우치를 들고 다니는 장면을 찍으려고 1년 넘게 스토킹까지 했다고 한다. 촬영 후 1년도 더 지난,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영상을 공개했다는 점에서 총선을 겨냥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런데 최재용의 이번 몰카는 사실 총선을 넘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기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재영 자신도 이런 사실을 굳이 부인하지 않고 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조선일보, TV조선이 의상실 몰카 보도를 했고, 그게 시너지효과가 나서 결국 탄핵까지 이어졌다”라고 당당하게 말했다. 그가 이런 점까지 의식하고 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탄핵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을 자백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이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최재영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한다. 최재영(62)은 양평에서 태어나 1995년경 도미한 후 미국 남가주에서 자주통일 운동가이자 북한교회와 북한종교전문가로 활동해 왔다. 또 NK VISION 2020을 설립해 남과 북을 왕래하며 만주에서 옥에 갇힌 김일성 주석을 구출했다고 하여 북한에서 추앙받는 손정도 목사(1882~1931)를 기념하는 학술원장으로서 매년 손 목사를 위한 학술 세미나를 열었다. 최재영 목사가 상당히 좌파 쪽 정치적 성향의 목사임을 짐작하게 해주는 대목이다.
거듭 말하지만 이 사건의 본질은 목사의 탈을 쓴 야비한 정치공작이다. 사람들은 ‘야비한 정치공작’이라는 사건의 본질은 외면한 채, ‘여성 명품 핸드백’이라는 부수적이고 선정적인 현상에 경도돼 김건희 여사를 비난한다. 그러나 이명수는 김건희 여사와의 7시간 녹취록으로 파란을 일으켰지만, 좌파의 정권 획득에는 실패한 뒤 절치부심 탄핵 공작을 시작했다. 그것이 바로 이번 디올 몰카 공작이다. 최재영과 이명수 그리고 어쩌면 그 뒤에 있을 어둠의 정치 세력들은 김건희 여사가 약한 고리라고 보고 김건희 여사를 타깃으로 삼았다. 그리고 타깃 공격 방법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서 재미를 본 몰카였다. 이렇게 재미를 본 좌파들이 다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자 계획한 음모가 바로 이번 김건희 여사 상대 몰카 공작이다. 따라서 최재영 목사가 아무리 번드르르한 말로 변명한다고 하더라도 이번 몰카 공작의 최종 목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고 1차 목표는 좌파의 총선승리다. 따라서 자유 우파 진영은 비상한 자세로 정권 지키기에 나서야 한다. 그리고 그 처음은 김건희 여사를 지키는 것이다. 김건희 여사를 지키는 것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바로 자유 우파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강신업 변호사, 정치평론가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