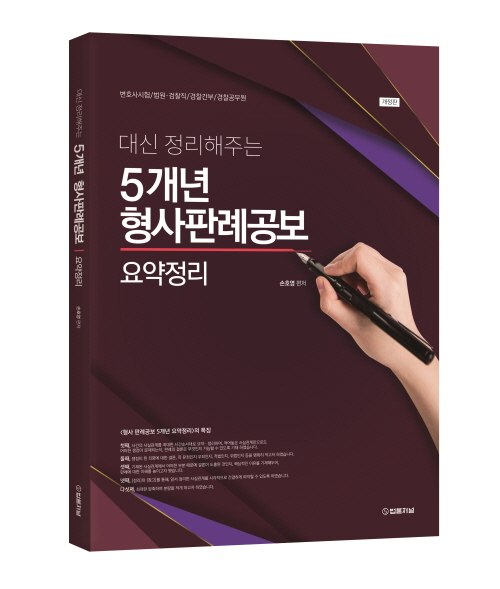당나라 시절, 가도(賈島)가 흥얼흥얼 시를 짓습니다. “한가로이 사니 이웃 드문데(閒居隣竝少), 풀 난 길은 거친 뜰로 이어진다(草徑入荒園), 연못가 나무에서 새 자는데(鳥宿池邊樹), 스님이 달빛 아래 문을 민다(僧敲月下門.)” 지어놓고 보니, 마지막 구절이 긴가민가합니다. 스님이 문을 “민다(推, 퇴)”가 좋을지, “두드린다(敲, 고)”가 나을지, 한참 고뇌합니다. 고민이 깊어 그를 태운 노새가 당시 수도를 지키는 경조윤 벼슬에 있던 한유(韓愈)의 행차를 방해하는 것도 그만 놓치고 맙니다. 처벌을 기다리는 그에게, 한유는 그토록 골몰하던 문제가 무엇이냐 묻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은 한유는 그 스스로 문장가이자 유학자였기에 흥미가 생겼고, 잠시 생각하더니 “두드리다가 어울리겠다.”고 합니다. 그 뒤 둘은 막역한 시우(詩友)가 되었다 합니다.
퇴고(推敲)라는 고사성어가 탄생한 이야기입니다. 한유는 정약용에게 시의 대현(大賢)이라 불릴 정도로 크게 평가받은 인물입니다. 정약용은 시경(詩經)에 나온 시의 의미를 이어받은 경우라야 모범이 된다고 여겼습니다. 시경의 시는 충신, 효자, 열녀, 진실한 벗들의 간절한 마음이 표현되어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역사적 사건을 시에 인용하면서도 흔적을 잘 보이지 않게 하는 두보(杜甫)를 시성(詩聖)으로 높이고, 글자 배열에 출처가 있으나 어구를 스스로 많이 지어낸 한유를 두보 다음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시에 있어 스페셜리스트인 한유가 가도로부터 그의 시를 듣고, 함께 ‘퇴’와 ‘고’ 어떤 글자가 시에 맞을지 고민할 수 있었던 것은, 어휘가 가지는 의미를 깊게 사고하고 탐구해왔던 그였기에 가능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느 글자를 적든, 무엇이 다른가 하는 근본적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스님이 문을 두드리든 밀든, 대강의 풍경은 그려지고 의미는 전달됩니다. 굳이 어렵게 단어를 이리저리 재는 것이 과연 어떤 효용이 있을까 갸우뚱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언어를 세공하는 가장 극단의 장르로서 시가 가지는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는 자체적으로 형식을 제한하고 양식을 갖추라고 합니다. 시가 발달하면서, 대체로 일정한 틀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한시(漢詩) 절구(絶句)는 오언(五言)과 칠언(七言)으로 나뉘었습니다. 두보의 시를 한번 보면, “강 푸르니 새 더욱 희고(江碧鳥逾白), 산 푸르니 꽃 더욱 붉다(山靑花欲然), 이 봄 보니 또 지나간다(今春看又過), 어느 때야 돌아갈까(何日是歸年)” 5개의 단어를 4구로 배열하는 식입니다. 일본의 하이쿠(俳句)는 세 개의 행으로 5, 7, 5음씩 이룹니다. “오랜 연못(古池や), 개구리 뛰어드는(蛙飛び込む), 물소리(水の音)” 하이쿠 시인 마쓰오 바쇼(松尾芭蕉)가 지은 하이쿠입니다. 우리나라의 시조도 3장 6구 4보격의 형식을 따릅니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뫼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마는, 사람이 제 아니 오르고 뫼만 높다 하더라” 양사언의 유명한 시조입니다.
엄격한 형식을 지키기 위해서는, 단어를 낭비할 수 없고, 적확한 언어를 골라야 합니다. 거꾸로 보면, 쓸모없는 단어를 버리고, 언어를 섬세히 벼리기 위해 지엄한 형식을 지켰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말하는 이와 듣는 이의 간극을 없애고, 서로 이해를 높이는 과정은 엄밀한 언어를 사용함이 우선입니다. 같은 말로 상호 간에 달리 이해하고 있다면,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언어를 정밀히 사용하여야 하는데, 이를 훈련하는 과정에서 놀이로서 시가 발달했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언어의 밀도를 높이고 정확한 의미를 찾으려 한다는 점에서 시와 법은 닮아있습니다. 예컨대, 민법에서 쓰이는 ‘합의’와 ‘협의’가 등장하는데, 그 뜻은 어떻게 다를까 고민을 하는 식입니다. 법전에서 쓰인 협의, 합의는 그 의미를 준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적 효력을 발생시킬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합의와 협의의 일상적 의미와 사전적 의미를 탐구하고, 법전에 적힌 합의와 협의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생각해봅니다. 이에 따라 혹시 민법전에 기재된 협의는 실제로는 합의의 의미이므로, 고쳐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는 것은 이러한 맥락입니다.
법에서는 법전의 문언을 해석하고자 노력하고, 그 해석론이 발달하게 됩니다. 또한 해석론을 참고하여 새로운 법을 제정할 때, 오해가 없도록 문장을 마련합니다. 이것은 마치 시에서 작법과 해법이 존재하는 것과 대응됩니다.
시와 법이 가지는 공통점은, 결국 ‘언어’가 가지는 중요성을 상기시킵니다. 법에서 ‘정의’ 조항을 법의 서두에 마련하는 경우가 있는 것도 바로 이해의 괴리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한가지 즐거운 상상을 해보는 것은, 시와 법이 맞닿아 있다면, 시인과 법조인도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법을 읽는 시인, 시를 쓰는 법조인, 어색하면서도 어울릴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손호영 서울회생법원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