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근욱 공단기 강사
밤 새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밤을 샐 때가 있다. 물론, 하얗게 지새우는 모든 밤이 같은 것만은 아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행복한 밤 새기란, 정말 쓰고 싶은 원고를 찾아 마음껏 쓰면서 나도 모르게 밤을 지새우거나, 좋은 책을 만나 새로운 것을 깨우치면서 아침을 맞이하는 경우이다. 어느 쪽이든 성취감을 느끼는 아침만큼 좋은 것은 없다. 반면에 그저 인터넷 서핑을 한다거나 단순한 소일거리를 하다 맞이한 아침은 그저 피곤할 뿐이다.
무언가에 열중해 밤을 새는 일 자체는 즐겁지만 사실은 손해다. 다음날 하루를 전부 잃어버릴테니. 미루어 놓은 일은 미루어 놓은 만큼 버겁다. 그리고 밤을 새우는 만큼, 몸은 더 무거워질 뿐이다. 그래서 그럴만한 가치가 있는 밤샘인지 스스로 돌아보곤 하지만, 그저 하릴없이 밤을 새우는 날도 있다. 그럼에도 무언가 열중하다 맞는 아침처럼 포근한 것은 없기에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나른함을 이기지 못해 밤을 새우게 될 때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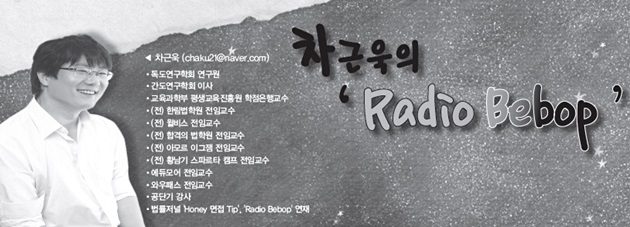
물론 호르몬 분비의 조화 때문에 밤 시간에 감상적이 되고 집중력도 올라간다는 사실은 안다. 하지만 단순히 과학적 설명만으로 밤의 매력을 설명할 수는 없겠지. 심연의 그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듯한 고요함. 밤은, 그렇게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을 만나게 해주니까.
모든 계절의 밤이 다 아름답지만, 가장 매혹적인 밤은 겨울 밤이었다. 겨울 밤이야말로 설레임 그 자체랄까. 어린시절의 겨울 밤에는 이야기가 있었다. 온 가족이 이불 속에 둘러앉아 도란 도란 옛날 이야기를 듣거나 꿈 이야기를 하였다. 그리고 늦은 시간 TV라도 모두 함께 볼라치면 그 시간이 그렇게 따스할 수가 없었다. 축구 중계를 보다가 아버지 무릎 위에서 잠드는 것도 좋았고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다가 잠 드는 것도 좋았다. 그 시절에는 크리스마스도 있었고 세뱃돈도 있었고 연날리기도 있었다. 이제는 모두 내게서 아득히 멀어져버린 것들이지만 마음 기댈 추억을, 나는 언젠가의 겨울 밤에서 얻었다.
군밤도 좋고 군고구마도 좋았다. 겨울 밤에는 따끈한 아랫목에서 책을 읽으며 이런 저런 간식을 먹었다. 어린시절 어머니와 함께 책을 보던 순간도 좋았고 나이가 들어 혼자 책을 읽으며 보낸 겨울 밤도 좋았다. 산골 토방 아궁이에서 불을 피운채 가만히 그 불빛을 들여다 보고 있는 것도 좋았다. 겨울 밤의 불꽃 속에는 낭만이 있었고 그리움이 있었다. 혼자인 겨울 밤도 있었지만 함께였던 겨울 밤도 있었다.
잊을 수 없는 책들은 대부분 겨울 밤에 읽은 책들이었다. 여러 권이거나 두꺼운 책도 있었고 얇지만 곰곰이 생각 하며 읽어야 하는 책들도 있었다. 방해받지 않고 온전히 책을 쌓아놓은채 실컷 집중해 읽을 수 있었던 시간은 비할 곳 없는 행복이었다. 그 시절에는, 시간이 천천히 흘렀다. 겨울 밤은 아주 길었고 내게는 충분히 숨 쉬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 그렇게 나는 겨울 밤으로 성장했고 어른이 되었다.
군 시절의 겨울 밤은 혹한기 훈련이 기억에 남았다. 밤새 산을 걷고 걷고 또 걸었는데 발목을 다치기도 했지만, 아름다웠다. 눈이 달빛을 받아 파랗게 번졌고 뽀드득 뽀드득 밟는 소리가 맑았다. 폐를 찌르는 듯한 청명한 산 내음이 고생이 고생인 줄도 모르고 좋았다. 그렇게 또 겨울 밤은 나를 남자로 길러 주었다.
밤이라는 시간은 알 수 없는 마력을 지닌다. 오롯이 혼자가 될 수도 있고, 그 어떤 다른이로부터도 방해를 받지 않을 수 있다. 낮보다 더 깊이 빠져들게 되어 결국 벌거벗은 자신과 마주하게도 된다. 부끄럽고 참담할 때도 있지만, 자신의 얄팍함을 직시할 수 있기에 스스로 겸손해지는 시간이기도 하다.
문득 혼자임을 발견한 밤은 슬프다. 사람들의 잘못이 아니다. 결국은 자신의 몫이다. 추위에 내민 손은 곡해될 뿐이고 그로 인해 진심은 왜곡된다. 결국 마음을 연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깨닫고 마음을 닫는다. 그렇게 혼자된 모습으로 밤을 맞이한다. 겨울의 깊은 밤, 결국 친구는 책 속에만 있을 뿐 숨쉬는 존재는 믿을 수 없다. 모두 두려움에 떨고 있을 뿐이니까. 시기, 원망, 질투, 인간의 한계는 곧 나의 허물이 된다. 그래서 밤은, 거울 앞에서 통렬히 책망하는 한탄이 되어 하얗게 재로 변해 스러지고 만다. 자신과 마주하는 날, 눈오는 고요는 그렇게 달콤한 고통이 된다. 창에 고인 성에에 손가락을 뻗어 이름을 써본다. 이름은 지나간 시간을 담고, 이제 이곳엔 아무도 없다.
모두가 말한다. 이것은 좋고 저것은 나쁘다고.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고. 그 한 가지 기준은 예외가 없다. 그 외의 모두는 획일화되고 적대시되고 비난이 된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포용하지 않고 이해하지 않는다. 그저 기분에 맞추지 않는 세상이 노여울 뿐이다.
밤 새는 날은 잘못되었을지도 모른다. 틀린 것일지도 모르고, 나쁜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밤을 지새우던 고뇌가 없었다면 추억도 없었을 것을 기억한다. 문제는 밤이 아니다. 문제는 그 밤에 존재하는 나다. 나는 이 밤에 무엇을 하는가. 깨어 있는가, 꿈을 꾸는가. 그도 아니면 그저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가.
효율성은 언제나 옳다. 물론 경제성도 당연한 진리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합리성만 남았다. 성찰이나 혜안이라는 것은 단순히 효율성과 경제성만을 추구하기 위한 것만은 아닐 텐데도 언제부터인가 흑백논리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아무도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렇게 비겁해 진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잊는다.
어리석은 밤도 있고 희열로 찬 밤도 있다. 추억으로 남은 밤도 있고 회한으로 아픈 밤도 있다. 하지만 그 모든 밤이 자신의 일부다. 결국 자신이 선택하고 자신의 인생답게 보내야 할 밤이다. 밤을 새웠다고 해서, 밤을 새지 않았다고 해서 그저 후회할 일은 아니다. 자신다웠다면 그것으로 족할 뿐이다. 생각도 판단도 모두 온전히 자신일 때, 비로서 내가 될 수 있으니까.
늦은 밤 집으로 돌아오며 올려다 본 겨울 하늘은 시리게 맑았다. 그 서늘한 별 빛에 취해 그 별을 따라 떠나볼까 궁리를 해 봤지만, 짊어진 끈을 놓을 수 없어 결국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 이젠 크리스마스도, 세뱃돈도, 연날리기도, 팽이치기도 없는 일상으로. 그렇게 다시 밤이 스쳐간다. 무심히도 눈부신 쪽빛의 새벽을 향해.


